
35장 執大象 天下往 집대상 천하왕 - 위대한 도를 잡고 있으면 천하가 제 갈 길로...
"(누군가) 위대한 형상(도)을 잡고 있으면 천하가 (제 갈 길로) 나아간다.
나아가도 해를 입지 않으니 (사람들은) 곧 태평하다.
음악이나 음식이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도는 입으로 표현해봐도 밋밋하여 맛이 없다.
그것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며, 그것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그것을 쓰려 해도 다하지 못한다."
이전 장(16장)에서 도는 곧 여의如意라 하였다. 도와 하나되어 여의를 얻은 마음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듯) 투명하고 자유롭다. 세상사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 그런 이에게 세상은 문제가 없고 온전하다. 세상사에 시달릴 일이 없다.
필자의 저서(비움과 치유의 근원 에너지)를 읽은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만물에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물질보다 근원에 가까운, 물질 이면의 기氣의 흐름인 에너지장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 에너지장은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 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여러장이라는 것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장이 마지막인 최고 수준이며 그 대표인물에 붓다가 있다. 그런데 에너지장 3장과 4장으로 드러나는 인물들 사이에는 유난히 큰 차이가 발견된다. 큰 깨달음을 얻은 인물로 보이더라도 세상에 관여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에너지장 3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4장을 넘어선 인물들은 세상으로부터 초연하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관심을 거의 완전히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
붓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린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붓다를 찾아가 울며 매달린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이럴 때 자비심이 우선이라면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능력이 우선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죽은 아이를 살려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붓다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집이 있다면 곡식 한 알씩을 얻어오라고 하였다. 온 마을을 다녀봤지만 어느 집에도 장사를 지내지 않은 집은 없었다. 단 한 알의 곡식도 얻지 못한 아이 엄마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
자비심은 높은 수준의 의식임이 틀림 없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원에 가까워지고, 모든 것은 비워지고 투명해진다. 이런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자의 표현처럼 천하는 제 갈 길로 나아가며, 누구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근원의 마음은 절대 고요이며 지극한 평화다. 팽창과 수축,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전체 우주 공간과 그 모든 공간을 포함한 무한한 시간을 모두 안고 있는 우주심(宇宙心)이다.
일상의 마음으로 꾸는 꿈을 떠올려보면 '나'는 꿈 속에서 특정한 캐릭터와 같은 사람으로 존재한다. 일상의 마음처럼 울고 웃고 두려워한다. 그런 감정들이 더욱 증폭되어 완전히 솔직하게 드러난다. 일상보다 더 크게 울고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두려워한다. 인간을 포함해 동물까지도 꿈 속에서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억압되어 쌓여있던 심리적 잉여에너지를 발산하고 해소시킨다.
반대로 보다 차원 높은 의식상태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동일한 경험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꿈에서 우리는 꿈 속 등장인물 중 하나의 캐릭터인 동시에 꿈 속의 모든 사건을 조망하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주인공이 울고 웃고 두려워하는 것을 본다.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주인공이 울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를 안스럽게 여기거나 다독이는 마음, 자비심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함께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렇게 관찰하는 의식은 완전히 초연하다. 꿈이라서 그런 것일까? 현실이 아니라서? 아니, 그런 관찰자 같은 의식은 현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런 초연한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뿐. 물론 오랜 명상의 내공을 바탕으로 주의 깊게 살핀다면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의식조차도 '도道와 하나' 라고 말할 수 없다. 조금 가까울지는 몰라도.
"음악이나 음식이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도는 입으로 표현해봐도 밋밋하여 맛이 없다.
그것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며, 그것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그것을 쓰려 해도 다하지 못한다."
수행(명상)은 도道 의 방향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끝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그것의 핵심은 비움이다. 그래서 그것은 밋밋하고 맛이 없다. 감각적이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찾는다. 수행에 관심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극히 감각적이다. 12장의 내용처럼 다섯가지 색깔의 빛과 소리가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기존의 감각적인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감각적인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한 것 같다. <응답하라1988> 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는가?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대중가요의 가사는 시詩에 가까웠다 - 사실 시는 또 얼마나 감각적인가? 요즘 대중가요는 너무 감각적이라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느리게 발달하던 세상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감각적인 자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치 조만간 용암처럼 들끓다가 결국에는 폭발해버리고야 말 것 같다.
수행은 감각적인 자극의 반대로 가는 것이다. 노자의 말처럼 도道의 속성은 감각적이지 않다. 어떤 수행 시스템에, 명상 그룹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감각적인 것을 일으키고 강조한다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행은 밥 먹듯이 해야 한다. 그 맛도 밥과 같아야 한다. '밋밋하여 맛이 없다' . 면, 빵, 치킨, 피자, 콜라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일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런 것들로 모든 끼니를 채울 수 없다. 여전히 주식은 밋밋하고 심심한 맛의 밥이다. 그리고 요즘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먹지 않는 경우도 많다. 두끼, 아니 일일일식(一日一食)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루 한 번은 밥 챙겨먹듯이 꼭 바른 수행의 시간을 챙겨보자.
- 明濟 전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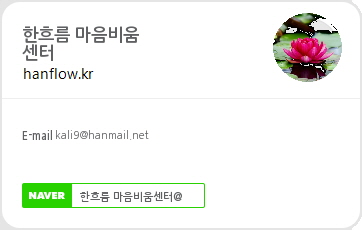
'붓다의 가르침 > [노자이야기] 붓다의 관점으로 풀어 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 도덕경(11)] 38장 上德不德 상덕부덕 - 명상과 불교수행으로 풀어 쓴... (0) | 2022.10.08 |
|---|---|
| [노자 도덕경(10)] 37장 道常無爲而無不爲 도상무위이무불위 - 명상과 불교수행으로 풀어 쓴... (2) | 2022.10.04 |
| [노자 도덕경(8)] 33장 지인자지 자지자명 知人者智 自知者明 - 명상과 불교수행으로 풀어 쓴 (2) | 2022.10.02 |
| [노자 도덕경(7)] 22장 곡즉전曲則全 - 명상과 불교수행으로 풀어 쓴... (0) | 2022.10.02 |
| [노자 도덕경(6)] 21장 孔德之容 공덕지용 - 명상과 불교수행으로 풀어 쓴... (2) | 2022.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