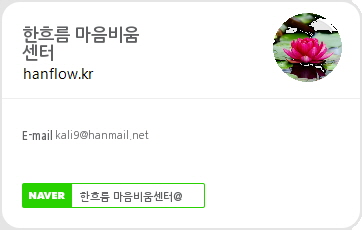[노자 도덕경(3)] 8장 上善若水 상선약수 - 명상과 불교수행으로 풀어 쓴

8장 上善若水 상선약수 -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고 있으므로 도와 가깝다.
머무는 곳으로는 땅을 최상으로 여기고, 마음가짐은 연못을 최상으로 여기며, 선한 사람과 더불어 행하며, 말에서는 믿음을 최상으로 여기고,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일에서는 능력을 최상으로 여기고, 행동에서는 시의적절함을 최상으로 여긴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게 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다. 이 장의 첫 문장 아래의 다른 문장들은 부연설명에 불과하다. 필자가 보기에 물의 성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은 수용성이 강하다. 물은 온갖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물은 온갖 곳에 침투해있다. 현대 의학정보에서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 반찬 등에도 상당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흙, 공기, 나무, 풀 등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연물들은 대부분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심지어는 건물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벽도 수분 제로상태로 완전히 말라있지 않다. 수분을 머금고 있다. 거의 모든 곳에는 물이 있다.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이자 바탕인 도道와 가깝다.
둘째로 물은 흐른다. 물의 흐름과 움직임은 인위적이지 않고 주변 조건을 수용하고 내맡긴다. 사실 노자의 핵심사상은 무위자연無爲自然 - 인위적으로 함이 없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다 - 이라 하듯 모든 자연물들은 기본적으로 도를 바탕으로 한다. 노자는 이런 자연물들 중에서도 으뜸을 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동양철학에서 자연을 대표하는 성질들을 모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다섯 개체로 대표한 것이 오행五行이다. 즉 자라고 성장하며 팽창하는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나무인 木이며, 이는 나무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무의 그러한 성질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다. 뜨겁고 확산하며 일시적으로 확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 火인 불이다. 만물의 생장의 바탕이 되며 움직임이 없고 느긋한 것이 土인 흙이다. 가장 단단하고 날카롭고 다른 것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金이다. 만물에 스며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없으나 생명의 근원이고 녹이고 섞으며 어우러지는 것이 물이다. 각각의 오행에 대한 이러한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독자들 각자가 목화토금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성질을 통찰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하나가 떠오른다.
"날 물로 보냐?"
앞에서 설명한 물의 성질이 특정인에게 대입되었을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물은 흔하다. 노자의 말처럼 낮은 곳에 임한다. 남과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절 못하는 예스맨,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를 물 같은 사람이라 한다. 노자는 과연 이런 물 같은 사람을 도와 가깝다고 칭송한 것일까?
잠시 이런 '물로 보이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자.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실실 웃으며 편하기만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적인 자아의 불편, 자책, 괴로움은 극에 달해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반대로 정말로 겉과 속이 모두 물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큰 강이나 바다 같은 사람이라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큰 평화의 내면으로 그를 접하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큰 물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런 사람을 상상하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자!???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미래에 되고자 하는 어떤 모습을 상정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방식은 절대로 노자의 방식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것은 공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군자는 인仁해야 한다, 사람들은 의리와 예를 지켜야 한다, 이런저런 도덕규범을 세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공자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노자 도덕경에서는 [5장 천지불인天地不仁] 등에서 공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주장하는 인仁에 대해 부정하는 구절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에서는 아예 대놓고 공자를 쪼다로 만든다.
필자도 노자의 이런 생각과 방식을 닮아서일까? 영향을 받아서일까? 나름 오랜 세월 바른 길을 찾아 수행을 통해서였을까? 어떤 사람이 되자는 상을 세워놓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길을 부정해온 편이다. 특정한 누구가 되려고 할 일이 아니다. 본래의 자신이 아닌 것들을 비워나가야 한다. 그저 비우고 버리다 보면 참된 자신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 자신만이 오롯이 남게 될 것이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에게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다만 바른 방법으로 비워나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붓다는 마지막 유연으로 자등명 법등명 自燈明 法燈明 - 자신이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히고, 가르침을 등불 삼아 밝히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을 것이다. 모든 가르침들은 비우기 위한 방편이다. 무엇을 비우는가? 탐진치를 비워야 한다. 그러면 투명해진다. 물과 같이.
- 明濟 전용석